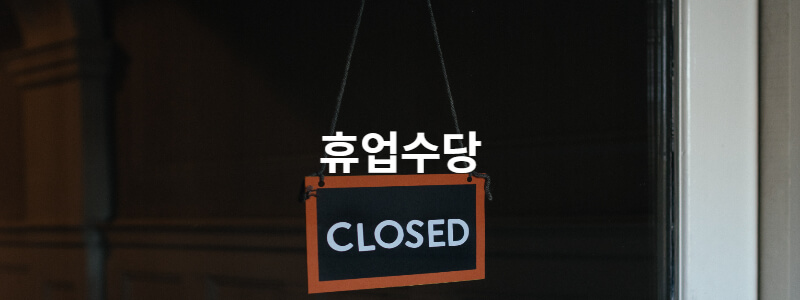
휴업수당이란 매출감소 혹은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며, 이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1. 조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에 따른 귀책사유와는 다르다. 고의나 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게 된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공장의 소실
-. 판매부진과 자금난
-. 원자재의 부족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
-. 경영상의 휴업 및 공장이전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례
-. 징계로서의 정직이나 출근정지
-. 휴직
-.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
-. 천재지변
2) 휴업을 할 것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이다.
2. 지급
1) 임금의 70%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휴업수당 산정
-.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 A 씨의 평균임금 200만 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140만 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 원 x 70% = 140만 원 < 통상임금 150만 원 (평균임금으로 지급)
-.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 B 씨의 평균임금 200만 원, 월 통상임금이 130만 원이라면 130만 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 원 x 70% = 140만 원 > 통상임금 130만 원 (통상임금으로 지급)
2)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휴업수당 산정
-.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임금의 일부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 C 씨의 평균임금 200만 원, 월 통상임금 150만 원이라면 70만 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 원 x 70% = 140만 원 < 통상임금 150만 원
→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200만 원 - 지급받은 100만 원) x 70% = 70만 원
-.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 D 씨의 평균임금 200만 원, 월 통상임금이 130만 원이라면 30만 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 원 x 70% = 140만 원 > 통상임금 130만 원
→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130만 원 - 지급받은 100만 원 = 남은 30만 원 지급
3)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거래처 상황,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 당해 업종 및 지역경제의 사정, 금융시장 상황 등 외적인 요인과 생산량, 매출액, 재고량, 영업실적, 근무시간 축소, 적자 부분의 계속성 등의 내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였는데 부득이하게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 법정기준(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기업도산으로 근로자 보호에 역행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그 밖에 성실한 노사협의 또는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3. Q&A
1) 노조의 쟁의행위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도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가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3) 근무시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경우는?
줄어든 연장근로 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
휴업기간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해야 한다.
댓글